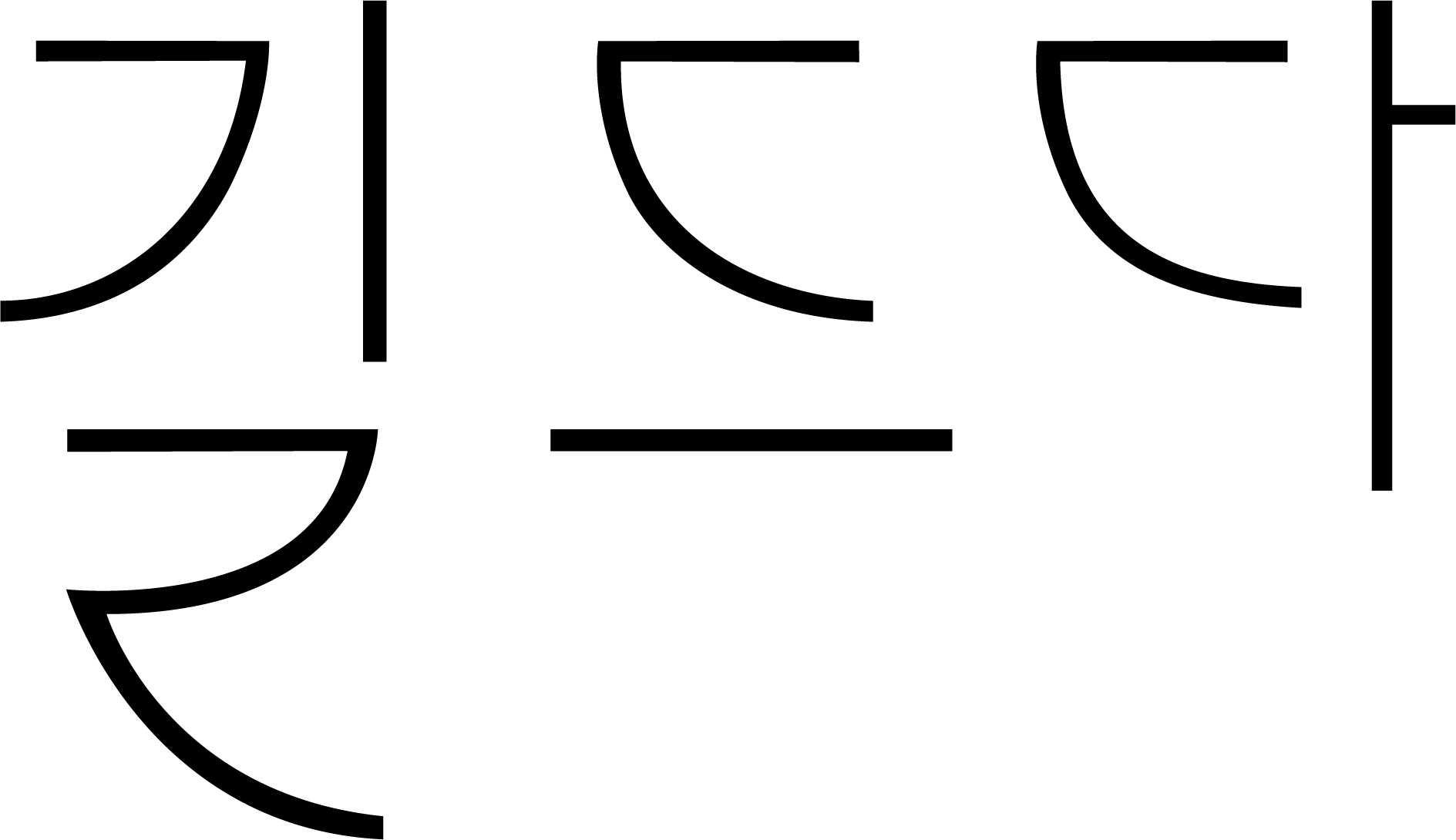<동물을 퀴어링!> 4회차 후기_반려종 선언문 정복기
업로드 날짜 : 21-01-02
글쓴이 : 재하
내가 처음 해러웨이의 글을 읽었던 때는 (지금은 사라진)밤사유 세미나에서였다. 그때 당시에는 가뜩이나 어려운 그 해러웨이 선언문의 텍스트들을 한번에 다읽으려 했으니 머리를 감싸쥐고 대관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는 허망함과 동시에 읽는 내내 맥락을 잘 이해하지도 못한 채로 해러웨이의 텍스트에 대해 꼬투리를 잡으며 반감 섞인 비판을 속으로 하던 나 자신이 기억이 난다.
무언가 있어보이기는 하는 텍스트들이었지만, 당시에는 접근할 수가 없었던 느낌이었고, 다 읽기에도 급급했던 나였기에, 결국에는 여러 개 잡으려다 다 놓친 사람처럼 책 내용을 거의 이해하지 못한 채 세미나에서 나보다 문탁에서의 공부내공이 훠얼씬 높은 사람들이 이해한 내용들을 듣기에 바빴다. 그리고 그 후로는 책장 어딘가에 꽃아두고 다시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뒤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예전부터 퀴어링 세미나를 하고 싶어서 기회를 옅보다가, 때맞침 이번에 문탁 홈피에 퀴어링 세미나 모집글이 올라와 있길래 다룰 텍스트들을 읽었는데, 우연히도 내가 그렇게 소화하지 않고 어딘가 다른 책들과 쌓아둔 해러웨이 선언문을 한다고 써 있었다. 안 그래도 어려운 텍스트였고, 지난번에는 포기했지만, 이번에도 다른 사람들이랑 읽기에 도전한다는 셈치고 읽어보기로 결심하였다. 이상하게 한 번 정복(?)되지 않은 책이었기에 이번에야말로 내 것으로 만들겠노라는 오기가 들었던 나는, 그러나 혼자서 그 일을 할 염두는 나지 않았던 나는, 이번 기회에 다시 도전해보기로 하였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준비되지 않았던 지난번과는 다르게, 쓰라린 패배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이미 책을 나가기 그 전 주부터 읽기 시작했다. 여전히 처음에 읽었을 때는 저번처럼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데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한층 한층씩 더 쌓여가는 개념들 속에서 갈피를 잃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읽어서 이해가 거의 안 되었어도, 이번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상대는 책 전체가 아니라 겨우(?) 선언문 하나였다. 그래서 그런지 전보다는 그나마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그게 조금일지언정). 더군다나 내가 이미 세미나 전 시간에 전에 접해본 적이 있다고 얘기해놓 터였기에, 하나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고 하기에는 부끄러움도 적잖이 있을 것이었다. 어쨌거나, 읽어야 했다. 읽는 내내 세미나 튜터인 고은 샘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다 못해도 괜찮으니까, 끝까지 읽어오시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화이팅!!' 마치 다 읽지 못할 것이라는 듯이(물론 고은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책에 대해서 감정이 남아있던 것이었겠죠), 그 말이 뇌리를 스쳤다. 그래서 매번 읽다가도 던져버리고 싶었을 때, 우려섞인(그러나 나에게는 하나의 도전으로 들린)그 말을 생각하면서 다시 책을 잡았다. 적어도 이번에는 이해해야 했다.
그런데 두번째 읽기 시작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마법인 것 마냥(정말 마법처럼) 책의 내용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무언가 달라진 것이 없는 듯 보였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해러웨이에게 쌓인 그동안의 꼬투리 잡던 반감도 사라졌다. 아마 해러웨이 식으로 말하자면 텍스트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의 '존재론적 화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세미나가 다가올 무렵, 나는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정도는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적어도 그렇게 느꼈다) 되었다. 비록 100쪽 남짓한 분량을 들고 매일 2주동안 전투에 임하듯 읽어서 차지한 (일방적인)승리(?)였지만, 나는 왠지 기분이 좋았다. 물론, 실상은 방에서 혼자 끙끙 대며 씨름했던 것이지만 말이다. 마치 한마리 개와 같았던 이 책은 처음에 어색했을 때는 공격적으로 나를 제대로 한 방 물었지만, 가까워지고 나니 꽤 괜찮은 얘였다.
해러웨이는 <반려종 선언>에서 존재론적 안무를 이야기한다. 이는 단순히 개와 사람만이 아닌, 관계 자체에 대한 사유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형식적인 면에서도, 철학적인 면에서도 기존의 철학과 대립해 있기도 한 느낌을 준다. 그에 따르면, 관계는 주체 이전의 것이며, 이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따라서 주체또한 고정적이지 않다. 주체는 관계로 인해서 만들어진다. 개와 나, 혹은 내가 타자와의 만남을 가질 때, 나와 '남'은 서로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변화한다, 즉 주체가 자기해체-재조립 과정의 운동을 끊임없이 거치게 된다. 이러한 해러웨이의 철학은 기존에 주체-객체에 대한 개념, 그리고 주체가 전제되어 있는 전통적인 철학에 반대한다. '나'는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변하는 존재이며, 관계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사유한다는 것은, 우리자신에 대해서 사유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해러웨이는 단순히 '타자'가 아닌, 타자성, 다시말해 남-임(타자임)을 긍정한다. 우리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적)합일을 이루려고 한다.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이들을 '나'로 변화시키려는 것이 그 예다. 요즘에 길을 가다보면 옷을 입은 강아지들을 많이 본다.
반려동물에게 사람과 동등한 위치를 부여하는 것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려종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수직적이 구분을 긍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인간에 대해 타자인 이들을 인간과 '동일함'을 부여하여 이해하는 형식, '문자 그대로의 인간형태화'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소중한 타자성'이다. 다시말해, 남인 것의 성격을 부정화하며 그것을 나로 합치시켜 넘어서려고 하는 방식을 비판하려하는 것이 해러웨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이다. 타자-임을 그것 자체로 존중하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해러웨이가 말하는 사랑이다. 사랑은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남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나와 남의 공간 사이에서 실뜨기 놀이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앞서 얘기했던 개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개를 (나의 자식이 아닌)개로서 이해하고 그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개에 대한 해러웨이식의 사랑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해러웨이는 부정을 긍정하고자 하는 이의 계열에 서 있다. 그는 모순과 복잡한 것을 사랑하고, 갈등을 즐기며, 타자인 상태를 반긴다. 그런 의미에서 해러웨이의 '개집'은 그동안 우리가, 아니면 적어도 내가 부정해왔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유하려는 놀이의 장이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읽었던 이유또한 여기에 있지 않나 싶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분노가 터져 나왔던 순간에, 어쪄면 나는 이미 해러웨이가 긍정하려던 부정들을 계속해서 부정의 영역에 나둔 상태에서 책을 읽어나갔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해러웨이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터무니없게 들렸었던 것은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들에 반해서였는지도 모르겠다. 모순과 복잡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리고 갈등을 즐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토록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물론 책의 엄청난 철학적 참조들과 난이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본다면 내가 가진 상의 견고함 때문이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런지, 해러웨이의 개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려있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과 동물과 사이보그에 관한 전복적 사유'라는 책의 겉표지에 적힌 설명은, 해러웨이가 책의 어디에선가 '나'를 거꾸로 뒤집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TXTLAB > 퀴어링! 워크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동물을 퀴어링!> 5회차 후기: 인터뷰 질문 만들기 (0) | 2022.01.21 |
|---|---|
| <동물을 퀴어링!> 3회차 발제 및 후기 (0) | 2021.12.30 |
| <동물을 퀴어링!> 2회차 발제 및 후기 (8) | 2021.12.30 |
| <동물을 퀴어링!> 1회차 발제 및 후기 (0) | 2021.12.13 |
| 퀴어링! 워크샵 S2 <동물을 퀴어링!>: 동물, 인간 그리고 타자성 (12/8 개강) (0) | 2021.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