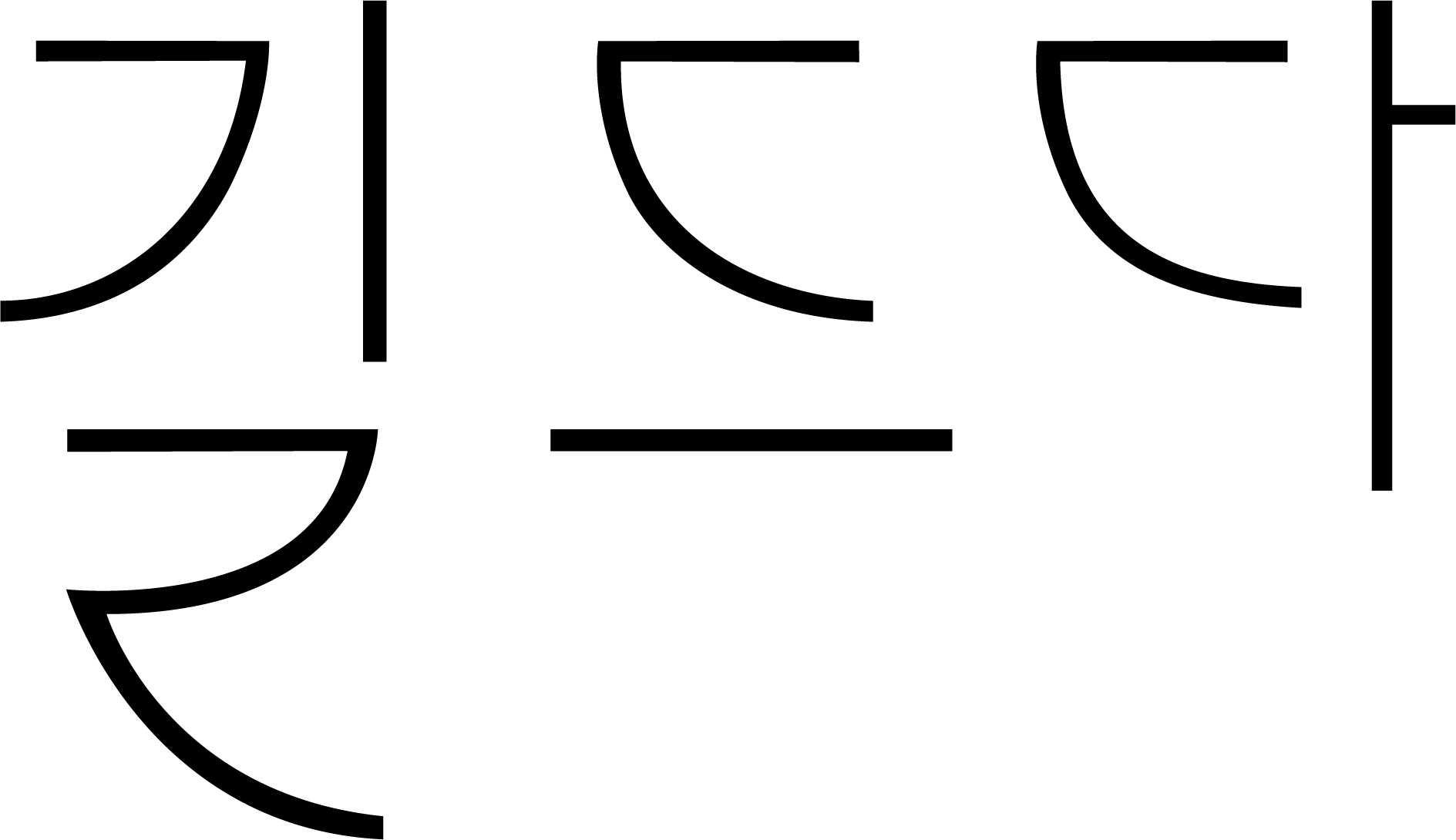2017 가을 첫 번째 시간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작성일: 2017년 9월 15일
작성자: 차명식
‘공존’을 주제로 한 중등인문학교 가을 시즌 <그리고, 모두가 함께 서기>가 마침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은 이탈리아 작가 죠반니노 과레스키의 연작 『뽀 강 마을 사람들』 시리즈의 첫 권,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이었고요.
『신부님』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시절, 이탈리아의 한 시골 마을인 ‘바싸’를 배경으로 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마을에는 두 사람의 유명인이 있는데요. 한 명은 마을 성당을 담당하고 있는 신부 ‘돈 까밀로’ 신부이고, 다른 한 명은 마을의 읍장이자 골수 공산당원인 ‘쥬세뻬 뽀따지’, 일명 ‘빼뽀네’ 읍장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힘이 장사에다 덩치도 크고, 또 성격도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보수적인 천주교 신부이고 다른 한쪽은 극렬 공산당원이니 정치적인 신념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지요. 힘은 팽팽한데 생각은 천지차이라,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일마다 두 사람은 사사건건 충돌합니다. 그 때마다 서로 윽박지르고, 을러대고, 주먹질과 발길질이 오가고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의 아주 특별한 등장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돈 까밀로의 성당에 계시고, 오직 돈 까밀로만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는 여기에 대해 아무런 배경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신부라면 당연히 위대한 성인으로 추앙받아야 할 것인데, 그런 일은 일체 없습니다. 돈 까밀로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신이 예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로 고뇌하지도, 부담스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예수에게 푸념하고, 변명하고, 능청을 부리고, 때로는 감사하면서,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한 어른을 대하듯이 거리낌 없이 말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그런 돈 까밀로를 보며 한숨을 쉬고, 놀려대고, 나무랍니다. 그 또한 신이 인간을 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말썽쟁이 제자를 대하는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그 때문에 이 책은 제목부터 ‘신부님’이 들어가고, ‘예수님’이란 말이 수도 없이 등장하는데도 전혀 성스러운 느낌이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책을 잘 뜯어보면 모든 이야기가 교회와 공산당이 대립하며, 지주와 노동자가 다투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남자와 여자가 다투고 다투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모든 이야기가 동화처럼 아름답게 풀려나가 훈훈한 엔딩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는 모습도 거의 없습니다. 곳곳에서 주먹질, 발길질, 욕지기, 속임수가 오갑니다.
그런데도 이 책은 종교적이라는 느낌도, 정치적이라는 느낌도, 혁명적이라는 느낌도, 그렇다고 비극적이라는 느낌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책의 놀라운 점입니다. 그토록 끊임없는 분열과 대립을, 폭력과 갈등을 보여주면서도 결국 이 책은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사실로 이끌어갑니다.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 책에 등장하는 아주 이상한 몇몇 장면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내 돈 까밀로를 시골로 몰아내놓고, 전전긍긍하다가 땀을 뻘뻘 흘리며 주교에게 돈 까밀로를 돌아오게 해달라 비는 빼뽀네에 대해서요.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빼뽀네가 검정고시를 치른다고 하자 실컷 비웃다가 결국 온갖 꼼수를 써가며 그를 도와주는 돈 까밀로에 대해서도요. 공산당의 적인 자유당 강사가 연설 도중 토마토를 맞자 킬킬대는 군중들에게 웃지 말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빼뽀네, 주먹으로 때리는 건 안 되지만 발길질 한 번은 용서하시겠다는 예수님, 그 외에도 수많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이런 이상한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분명 서로 대립하는 입장인데도 정작 상대가 아주 심하디 심한 곤경에 빠지면 욕지기를 뻑뻑해대면서 자신의 입장을 누그러뜨리고 도와주는 모습들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서로 대립하고 싸우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증오하지는 않는구나. 그들을 맞서게 만드는 것들, 정치적인 입장, 돈의 유무, 세대 간의 차이, 성별. 그 모든 것들을 벗겨내고 난 알맹이에는 선한 마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요.
물론 이 책은 결코 그러한 ‘껍질’들, 정치적인 신념과 계급 차이, 세대 차이, 성별 차이에서 오는 갈등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빚어지는 있을 법한 갈등들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그것들로 고뇌하는 모습들을 그려내며, 그것들이 동화처럼 쉬이 풀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과 쉽게 내던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맞서고 대립하는 관계에서도 최소한 지켜져야 할 것들이 있음을, 또한 그것을 지키는 한 대립하는 이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 책의 작가인 죠반니노 과레스키는 참전군인 출신입니다. 이탈리아 패잔병으로서 독일군 소용소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는 ‘대립’이, 수많은 차이가 빚어내는 싸움이 극한까지 치달은 상황인 ‘전쟁’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전하는 메시지 - 우리를 갈등하고 대립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들춰내었을 때 그 아래에는 여전히 선한 마음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선한 마음을 지키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다투면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 은 작가가 가진 인간에 대한 위대한 믿음과 공존에 대한 크나큰 가르침을 줍니다.
촌스러운 마을 바싸, 무식한 마을 바싸, 야만적인 마을 바싸. 세련된 민주주의과 인문학적 지식, 개방적이고 탁 트인 공감 능력 따위는 찾기 힘든 1900년대 중반의 이탈리아 농촌이 보여주는 ‘함께 살아가는 방법.’ 거기에도 분명, 오늘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공존의 형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공존의 방식을 살피는 것이, 앞으로 이번 시즌에서 우리가 할 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세미나, 행사 > 중등 인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7 가을 세 번째 시간 <그랜토리노 2> (0) | 2018.03.11 |
|---|---|
| 2017 가을 두 번째 시간 <그랜 토리노 1> (0) | 2018.03.11 |
| 문탁중등인문학교 2017년도 가을 시즌 안내 (0) | 2018.03.11 |
| 2017 여름 열 번째 시간 <최종 에세이> (0) | 2018.03.11 |
| 2017 여름 아홉 번째 시간 <에세이 피드백> (0) | 2018.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