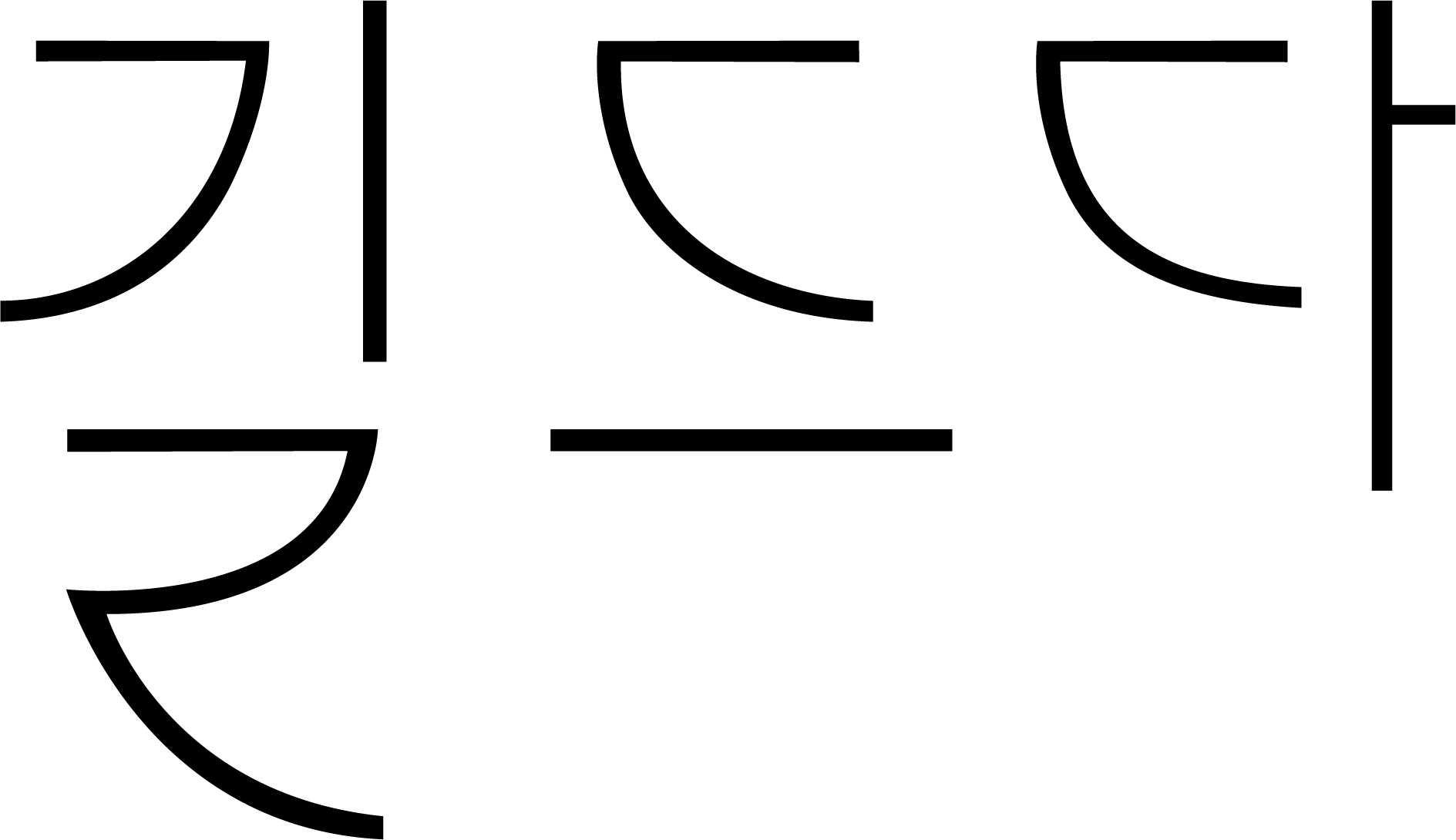[길위의 민주주의] 프로젝트 <밀양에서 만난 모든 분들께>
길 위의 민주주의 개인 프로젝트
김시현 작
편지 <밀양에서 만난 모든 분께>
밀양에 다녀온 지 벌써 세 주나 지났네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나름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길 위의 민주주의를 마무리하면서 밀양에서 느낀 것들과 다녀와서 한 생각들을 정리해봤어요.
밀양을 가기 전 주쯤 “길 위의 민주주의”에서 왜 밀양을 가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분명 정할 때 이유를 들었는데 책 내용이 다 날아가서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계속 밀양이랑 민주주의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히말라야 쌤을 인터뷰할 때 얘기하기도 했는데 확실한 답이 안 나와서 다녀와서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갔습니다. 밀양에 가서 민주주의 얘기를 딱히 먼저 꺼내진 않았는데 계속 공권력, 국가, 국민 같은 단어들이 들리더라고요. 특히 공권력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하는 말은 모든 분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국가에게 권력을 위임하고 국민이 됐습니다. 경찰이 도둑을 잡고 군대가 북한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준 힘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경찰은 보호하는 게 아니라 끌어내고 있었네요. 왜 밀양분들이 경찰을 때리면 재판이 열리고 경찰이 때리는 것은 정당화될까요? 정당한 폭력이 있나요? 3월에 들은 법이 폭력적이고 신적 어쩌고 하는 얘기가 머릿속에 엉켜있네요.
밀양에서 이야기를 듣고 영화를 볼 때는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집에 와서 정리하다 보니 밀양과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국가의 폭력에 무감각했는지 알게 됐고요. 경찰이나 군대는 나 같은 착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거라고만 생각하고 관심이 없었는데 그 힘이 나에게 향할 수 있다곤 생각을 안 했어요.
수현이 언니가 밤에 ‘세상에 문제가 너무 많은데 모든 문제에 밀양처럼 공감하고 연대해야 하는가, 우리 모두가 활동가처럼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자리에선 당연히 못 하지! 하고 말았는데 돌아와서 민주주의보다 기억에 남은 건 그 질문이었어요.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세상에서 모든 일에 연대하고 투쟁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현이 언니가 말했을 때는 새로운 문제가 더는 안 생기게 노력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밀양이건 어디건 머리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더라고요. 어진쌤은 학교를 안 나가고 밀양에 왔다가 지금까지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왜 그렇게 못하나, 안 하나 하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는 어딘가에서 활동가로 살아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은 옛날부터 고민하던 건데 잊고 있다가 밀양에 갔다 와서 다시 생각이 났어요.
사실 철탑이 들어서고 밀양은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왜 계속 포기하지 않고 싸우시는지 여쭤보려고 했어요. 제가 질문을 하기도 전에 평밭마을에서 1:7로 경찰을 이기셨다는 할머니께서 “우리는 늙어서 솔직히 지금 죽어도 상관없지만 너그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땅을 물려주고 웃으면서 죽고 싶어서 계속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 때문에 계속 싸우고 계셨는데 나는 잊고 있었던 거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동안 밀양에서 송전탑과 공권력에 맞서 싸워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번에 이야기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또 봬요!
'지난 세미나, 행사 > 청소년 길 위의 인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길위의 민주주의] 프로젝트 - 그림, 사진, 캘라그라피 (0) | 2018.03.05 |
|---|---|
| [길위의 민주주의] 프로젝트<우리는 밀양이다.> (0) | 2018.03.05 |
| [길위의 민주주의] 밀양을 다녀오다, 전시회 (0) | 2018.03.05 |
| [길위의 민주주의] 밀양을 다녀오다(2) (0) | 2018.03.05 |
| [길위의 민주주의] 밀양을 다녀오다(1) (0) | 2018.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