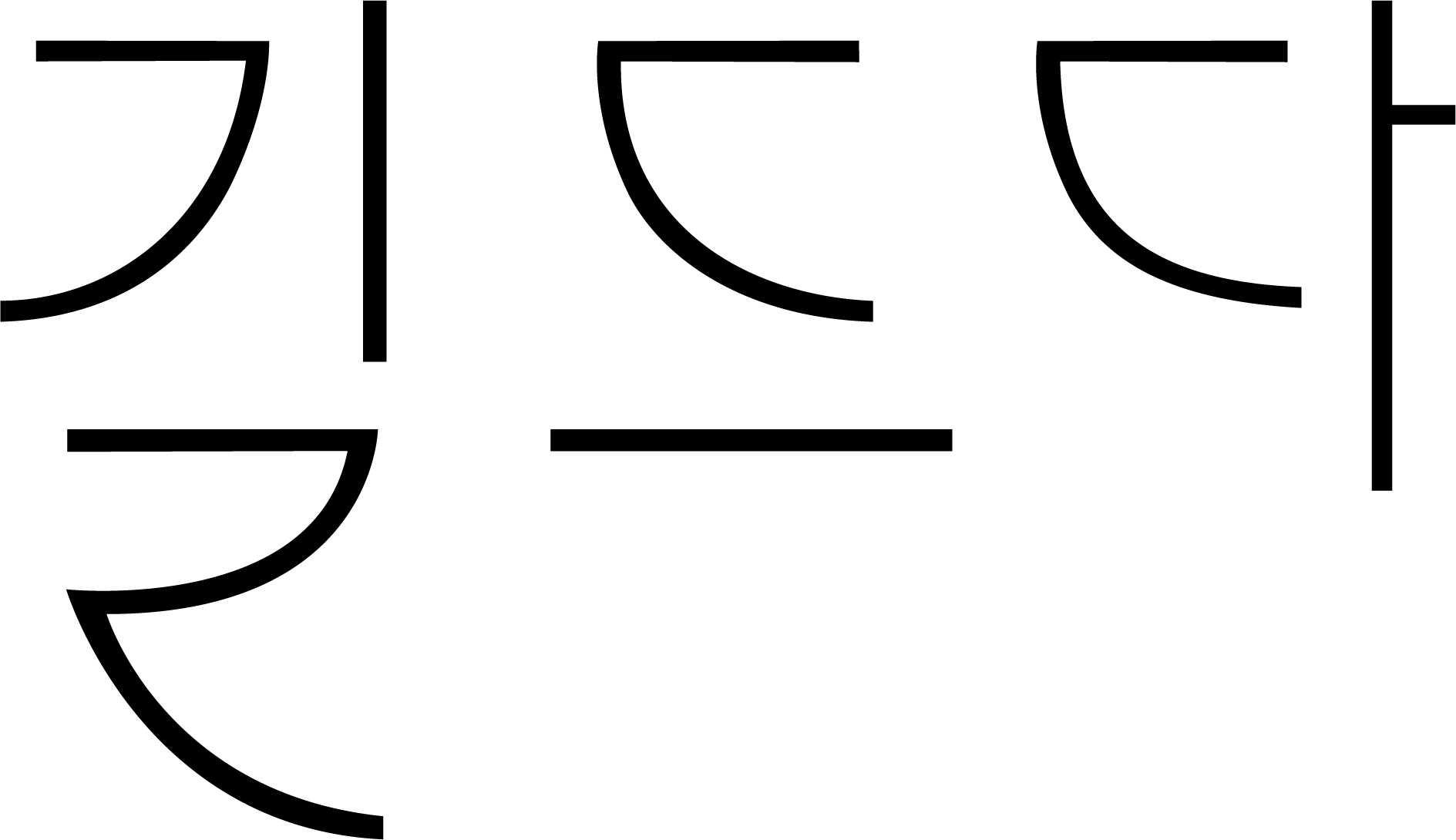2020 중등인문학교 S1 <마을이란 낯선 곳> 네 번째 시간 후기
2020 중등인문학교 시즌1 <마을이란 낯선 곳>의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난번 『아홉 살 인생』에 이어 오늘은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 연작을 읽었는데요. 이 책은 두 번에 걸쳐서 읽을 계획이라 오늘은 앞의 절반 부분에 해당하는 다섯 편만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원미동 사람들』은 『아홉 살 인생』과 마찬가지로 서울 외곽의 한 동네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과 인간 군상들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다루는 책입니다. 다만 한영이가 짚어주었듯 『아홉 살 인생』의 경우 여민이라는 아홉 살 아이의 시점으로 그 모든 풍경을 바라보지만, 『원미동 사람들』은 일정한 관찰자 없이 다양한 시점과 형식으로 그 풍경들을 그려낸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홉 살 어린 아이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도 분명 있는 것이겠지요.
첫 번째 이야기 <멀고 아름다운 동네>는 말 그대로 원미遠美동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 원미동으로 이사오기까지의 이야기지요. 가람이가 지적했듯, 사실 이 이야기는 원미동 사람들 연작의 프롤로그 격인만큼 이 이야기만으로 원미동이 어떤 곳인이며 앞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짐작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만으로도 이 책이 얼마나 세심하게 원미동의 삶을 그려낼 것인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된 이유, 이사 과정에서 생긴 일들, 이사라고 빠지는 것에 눈치를 주는 상사 이야기 등은 정말 우리 현실에서도 충분히 있을법한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세심한 필치로 그려내는 원미동의 삶, 도시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볼만한 건 도시의 삶에서는 ‘익숙해야 하는 것’과 ‘낯설어야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시골과 달리, 도시는 그 엄청난 규모 때문에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수많은 낯선 존재들이 뒤섞이는 공간, 그것이 도시지요. (역사적으로 봐도 전국 방방곡곡의 사람들이 다 서울로 모여들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뒤섞여 있기에 도시에서의 삶은 더욱 엄격하게 나누어지고 정리됩니다. 가족, 친척, 친구, 선생님, 직장동료 등 ‘익숙해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맺어야 하는 정해진 방식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두리 바깥의 ‘낯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경계의 대상이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관심을 주거나 일부러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리를 두어야 하지요.
가령 두 번째 이야기 <불씨>에서는 회사를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외판원이 되어 조악한 장식품을 팔게 된 가장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물건에 대해 설명하고 물건을 팔아야 하는 입장이지만 스스로도 그것을 너무나 어려워하고 사람들의 반응 또한 냉담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를 거절합니다. 사실 당연한 일이지요. 우리라도 낯선 사람이 갑자기 친근한 척 말을 걸며 물건을 팔려고 하면 피해버리지 않겠어요?
또 네 번째 이야기 <원미동 시인>에는 일곱 살 여자아이 경옥이가 주인공인데, 이 경옥이는 시 밖에 몰라 시인이라 불리는 동네 백수 청년 ‘몽달 씨’나 슈퍼주인 ‘김반장’을 자기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 요즘 기준으로 그런 경옥이를 봤을 때는 사실 그건 굉장히 위태로운 광경일 겁니다. 일곱 살 여자아이가 스물 훌쩍 넘은 남자들, 가족도 아니고 학교 선생도 아닌, ‘타인’인 어른들을 친구라고 부르면서 졸졸 따라다닌다? 모르긴 몰라도, 어쩌면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이 정한 관계의 규칙에서 어긋나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와 같은 ‘테두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확고해지고 또 좁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도 믿지 마라. 믿을 건 가족뿐이다.’에서 또 ‘가족도 믿지 마라’는 말도 나오니까요. 그것은 동시에 낯설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할 ‘타인들’, 내가 외면해야 하고 신경 쓰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같은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 ‘이웃들’에 대해서도 점점 더 외면하게 되지요. 보기에, 『원미동 사람들은』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어떤 사람들을 외면하는가? 어디까지가 그 범위이며, 그 이유는 또 뭔가? 또 그것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우리는 <원미동 시인>의 막바지에서 ‘몽달 씨’에게 친한 척 굴다가 막상 몽달 씨가 곤경해 처하자 외면한 ‘김반장’의 모습을 보며, 경옥이가 그러하듯 분노합니다. 또 다섯 번째 이야기 <한 마리의 나그네쥐>에서, 암시적으로 등장하는 광주 518의 기억과 그 현장을 목도하고 인간불신에 빠져버린 어떤 가장, 그리고 그 가장의 정체를 그저 안줏거리로 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였다면 어땠을까’하고 질문을 던지면 또 쉽사리 누가 옳고 그르다고, 나라면 당연히 어떻게 했을 거라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과 그에 뒤따르는 어려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원미동 사람들』을 끝까지 읽고 더 많은 이야기와 함께 이 문제를 다루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지난 세미나, 행사 > 중등 인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0 중등인문학교 S1 <마을이란 낯선 곳> 여섯 번째 시간 후기 (0) | 2020.08.11 |
|---|---|
| 2020 중등인문학교 S1 <마을이란 낯선 곳> 다섯 번째 시간 후기 (0) | 2020.07.30 |
| 2020 중등인문학교 S1 <마을이란 낯선 곳> 세 번째 시간 후기 (0) | 2020.07.13 |
| 2020 중등인문학교 S1 <마을이란 낯선 곳> 두 번째 시간 후기 (0) | 2020.06.29 |
| 2020 중등인문학교 S1 <마을이란 낯선 곳> 첫번째 시간 후기 (0) | 2020.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