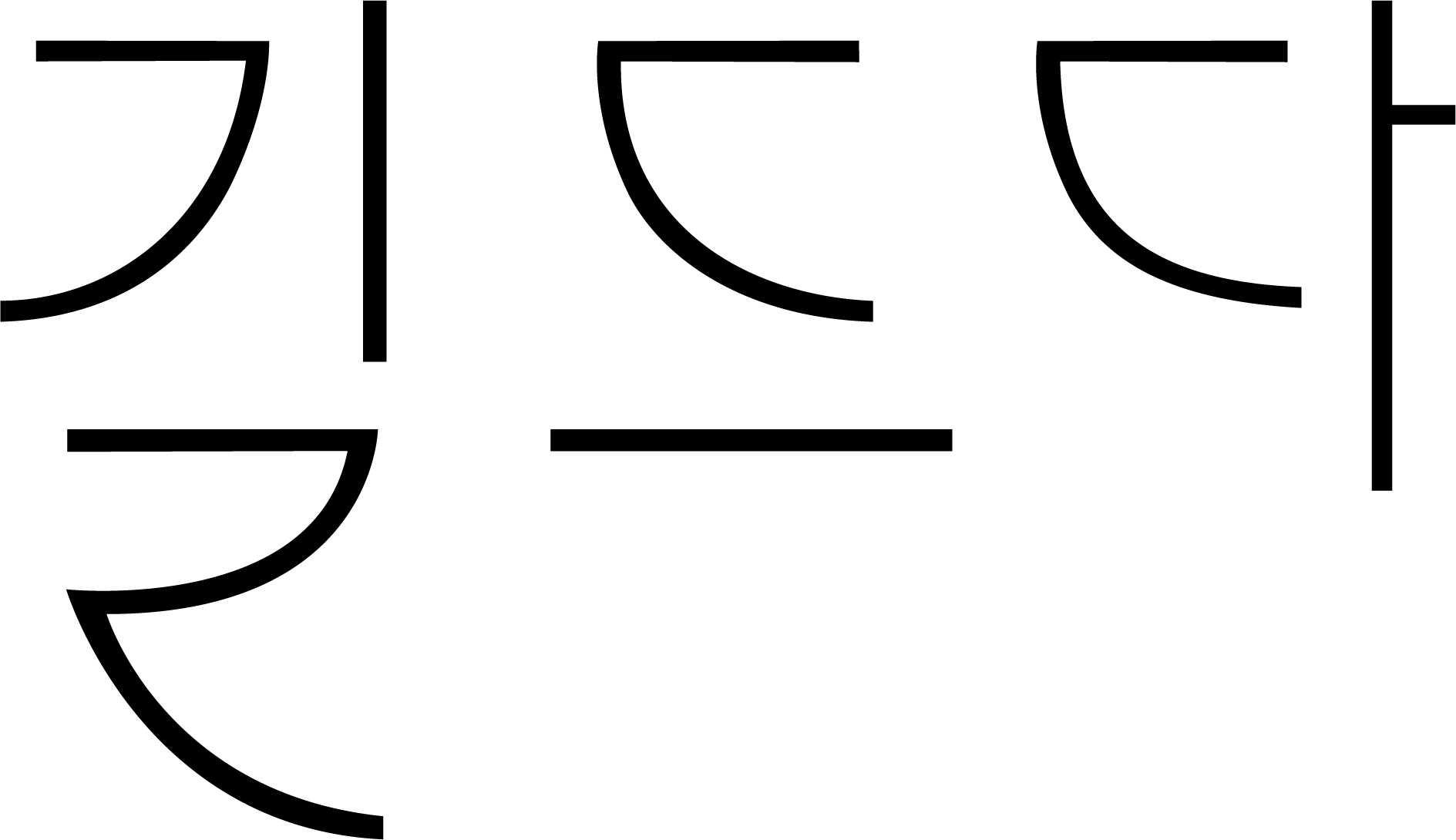[걸 헤이 유교걸 1회] 미련하고 성실하게 질문하기
*[걸 헤이 유교걸]은 길드다 김고은의 북&톡 연재글입니다.
한때 유교를 사회악이라고 생각했던 20대 청년이 <논어>를 읽으며 유교걸로 거듭나는 과정을 담습니다.
미련하고
성실하게
질문하기
불안정한 하루하루
새 향수를 샀다. 플라워 계열 중에서도 부담스럽지 않기로 유명한 향수였다. 얼핏 이모 화장품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했지만, 낯선 향이기만 하면 괜찮았다. 향수를 즐겨 뿌리고 다녔던 적이 없었기에 신경을 좀 썼다. 옷장을 열면 잘 보이는 곳에 향수를 뒀다. 작은 향수 공병을 사서 늘 가지고 다니는 파우치에 넣어두었다. 다음날 입을 옷을 생각해 두었을 땐 미리 옷에다 향수를 뿌려놓고 잠들기도 했다.
리프레쉬가 필요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몇 달째 기승을 부리면서 일에 차질이 생겼다. 기대했던 공부도, 오래 준비했던 활동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길드다에 멤버변동까지 생겼다. 나는 상황을 정리하고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해 친구들을 살폈다. 한 명 한 명 찾아가 생각을 물었고, 다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말을 아끼고 듣는 일에 집중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 친구들의 어떤 말은 이해할 수 없었고, 어떤 행동엔 약간 불쾌함도 느꼈다. 모든 상황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는 것 같아 갑갑했다.

향수 뿌리기 규칙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향이 조금씩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탑노트의 베르가못 향은 주변 환경까지 산뜻하게 만들어줬고, 맨 마지막에 남은 베이스노트의 머스크 향은 포근한 느낌을 주었다. 산뜻함과 포근함, 바로 내가 원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효과는 일시적이었다. 향이 증발하기 전까지, 후각이 향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만 유효했다. 베르가못 향과 머스크 향이 코끝을 스치고 지나간 다음이면 곧이어 깜빡 잊고 있었던 것들이 달려들었다. 향수로도 불안정한 일상을 완전히 가릴 수는 없었다.
미련하고 성실한 증자
『논어』를 읽어본 사람 중 일상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문장을 먼저 들여다 볼 것이다. 이 문장은 사자성어 ‘일일삼성’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논어』의 첫 편 「학이」에 있어 그냥 지나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曾子曰 : “吾日三省吾身 : 爲人謨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 (1:4)
증자가 말했다.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나를 되돌아본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을 도모할 때 성의를 다했는가? 친구와 사귈 때 신의가 있었는가? 배운 것을 제대로 익혔는가?”
증자는 공자가 말년에 만난 제자 중 한 명으로, 공자에게 “노둔하다(魯)”라고 평가를 받기도 했다.(11:14) 노둔하다는 말은 상황에 맞춰서 민첩하고 영리하게 움직이는 사람보단, 둔하고 어리석게 구는 사람에게 잘 어울린다. 둔하다고 해서 게으르다는 뜻은 아니다. 노둔한 사람은 실리에 연연하지 않기에 잔꾀를 부리지 않을 뿐 매우 성실하기 때문이다. 또 고집을 부린다는 의미도 아니다. 고집은 이익을 따지면서도 뜻을 꺾지 않아 융통성 없는 것이지만, 노둔함은 실리를 염두에 두지 않아서 미련한 것이다. 46살이나 어린 제자가 젊은이답지 않게 꾀도 부리지 않고 미련하게 구니, 스승이 보기엔 조금 안쓰러웠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자는 “노둔하다”고 말하며 혀를 끌끌 차면서도, 동시에 내심 흐뭇한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공자의 제자 중엔 재주가 볼만한 자들이 많았지만, 공자는 뛰어난 재주를 마냥 높이 사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두고 기세가 대단 하지만 의욕이 과하다며, 실제로 해내는 일은 서툴고 거칠 뿐이라고 말했다(5:21). 재주를 이용해서 재빠르게 움직이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을 찾아낸다면, 자기 능력에 취해 허세를 부리거나 실수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증자의 기세는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로 느렸지만 그가 이루게 된 것은 작지 않았다. 증자가는 공자가 죽고 난 뒤 후학을 이었다.
질문을 잘못하면 남탓이 된다
나의 향수 뿌리기는 일종의 지름길, 불안정한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나기 위한 꼼수였으나 미약하고도 허술했다. 증자라면 향수를 뿌리는 대신 뭘 했을까? 이 문장에 따르면 증자는 매일매일 질문했다고 한다. 증자가 살폈던 세 가지 상황―일하고, 친구를 만나고, 공부하는 상황―은 그의 일상 거의 전부였다. 그러니까 그는 미련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상에서 질문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얼핏 보기에 일상에서 질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길드다 멤버변동이 발생했을 때 나 역시도 질문하지 않았던가. “저 친구는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사실 이 질문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내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A를 향해 있었다. 우리는 멤버 변동 사건이 있기 전부터 그와 비슷한 일들에 대해 오랫동안 대립해왔다. 가령 사업을 기획할 때 A는 본인이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했다. 반면 나는 우리가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럴 때마다 A는 나에게 과하다고, 나는 A에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A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며 한발 물러났고, 나는 그런 A를 보며 이해하기 어려웠다.
처음 나의 질문은 A의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시작한 것이었지만, 실제로 A를 이해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말은 너무 본인의 감정에 치우쳐 있어 문제고, 어떤 말은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려 해서 문제라고 생각했다. 질문은 어느 틈엔가 A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대개 사람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질문의 화살을 상대에게 돌린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단, 곤란한 상황일 땐 나와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상대가 쉽게 눈에 띄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든, 이런 질문은 상황을 곤란하게 만든다. 상대방을 향해 질문하게 되면 상대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므로, 질문이 남 탓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신의 기준에 대해 질문하기
증자의 두 번째 질문은 나의 경우와 비슷하다. 증자의 질문은 남 탓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까? 뜻을 함께 이루려는 친구, 즉 동료와 함께 하는 상황에서는 남 탓하기가 특히나 좋다. 뜻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서 문제를 찾기 더욱 쉽다.
與朋友交而不信乎?
친구와 사귈 때 신의가 있었는가?
그러나 증자는 동료를 향해 질문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동료와 함께 할 때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행동했는지 물을 뿐이다. 그의 질문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 자기 자신을 향해 질문하기는 쉽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자책하거나 연민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일부러 질문의 화살을 자신에게로 돌리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증자의 질문은 자책이나 연민과는 거리가 멀다. 문장을 조금 더 살피다 보면, 증자에게서 일종의 팁을 얻을 수 있다. 증자는 스스로에게 질문 할 때 확실한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 세 번째 상황인 증자가 공부할 때 이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傳不習乎?
배운 것을 제대로 익혔는가?
증자의 질문에는 확실히 대답하기가 어렵다. “공부할 때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는가?”하는 질문을 받고 어느 누가 스터디플래너에 하는 것처럼 “오늘 했음, v”하고 체크할 수 있을까? 설령 누군가 호기롭게 이처럼 대답한다고 하더라도 증자의 질문은 거기서 끝나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어째서 배운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고 생각했는가? 나에게 공부한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증자의 질문은 평가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다. 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행동의 정도가 아니라 척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앞서 질문이 외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했음을 상기해본다면, 결국 질문함으로써 돌아보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기준을 향하는 질문은 상대를 향하지도 않고, 스스로를 파고들어 자책하게 하거나 연민에 빠질 틈을 주지도 않는다.
爲人謨而不忠乎?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을 도모할 때 성의를 다했는가?
증자의 첫 번째 질문,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스스로 성의를 다했냐는 질문에 나는 여태까지 별 고민 없이 그렇다고 답해왔다. 그러나 증자가 질문하는 방식을 따라 내 성의가 무얼 의미하는지 생각해본다면 대답하기가 어려워진다. 열심히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한 생각이 결국 A에게서 문제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불안정했던 건 이해할 수 없는 A 때문이 아니라, A를 받아들이지 못한 나 자신의 기준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느리고 답답한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른다
『논어』를 펼치자마자 만나게 된 이 문장을 보고 난 뒤로 되도 않는 재주 부리기를 그만두기로 했다. 대신 내게 물러설 수 없다고 여겼던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 A에게 “너의 방식이 내겐 포기처럼 보였지만, 너의 말마따나 그것이 애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A와는 한동안 굳은 얼굴로 멀찌감치에서 서로를 대했는데, 그 말을 한 날은 A가 세미나 쉬는 시간에 싱글벙글 웃으며 굳이 내 옆에 오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초코빵을 먹고 갔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것에 비하면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건 느린 일이고, 단박에 어떤 선택을 해내는 것에 비하면 기준을 자꾸 되묻는 건 답답한 일이다. 무엇보다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우직하고 미련하게, 딴 길로 새지 않으면서 느린 길로 성실하게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나는 증자처럼 질문하며 사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질문하는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것이 자신에게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남을 이해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거나, 더 나아가 남을 탓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다. (끝)
'Writings > 김고은의 [걸 헤이 유교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걸 헤이 유교걸 3회] 자의식 부풀리지 않고 SNS 사용하기 (0) | 2020.12.14 |
|---|---|
| [걸 헤이 유교걸 2회] 말해지지 않은 것까지도 살펴보기 (0) | 2020.09.22 |
| <당사자 되기> (0) | 2020.06.25 |
| 보릿고개 프로젝트] 김고은의 GSRC 프리뷰 -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0) | 2020.05.22 |
| [보릿고개 프로젝트] 김고은의 GSRC 프리뷰 - 개연성 없는 연애, 소설 (0) | 2020.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