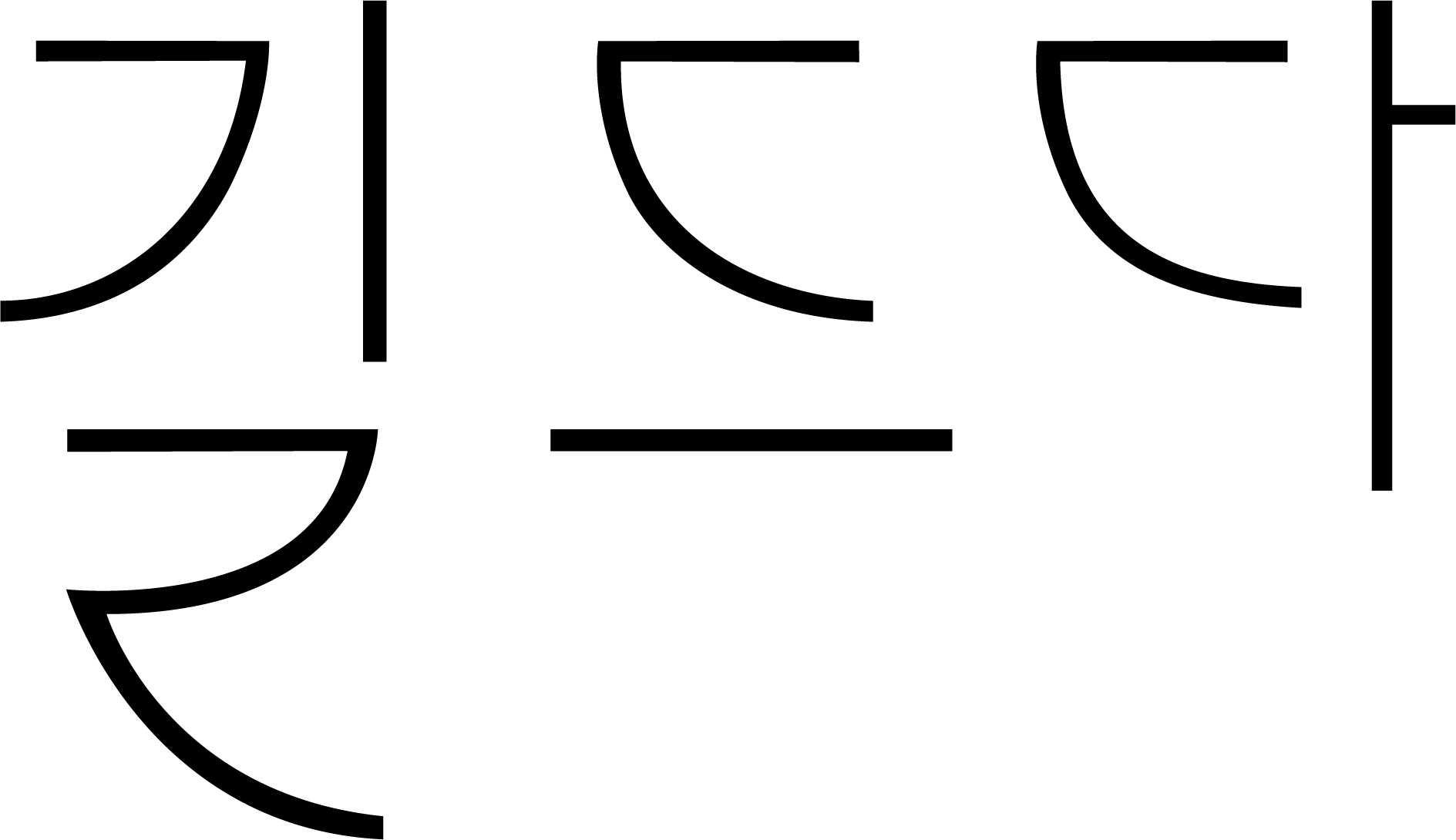[4인 4색 미니강의] 10월 두번째 강의 후기
9월에 이어 10월 두번째 강의가 열렸습니다~
지난번에는 북적북적하고, 길드다 공간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에 어색했다면
이번에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강의는 역시 재밌더라구요.!!
첫순서는 차명식씨 였습니다.
차명식씨는 직장에 대해 세넷의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의 직장에서는 개인의 선택이 곧 개인의 책임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현대 이전의 직장에서는 서로의 친밀함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 이전 세넷의 이야기입니다)“신발공장의 한 노동자는 술을 마시고 와서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본 세넷이라는 학자는 당연히 저 사람이 술을 마셨다는 선택을 했으면 책임도 져야한다고 외쳤지만 다른 노동자들은 술을 마신 노동자의 행동을 숨겨주었습니다. 웃긴 건 술을 마신 노동자도 그들이 왜 숨겨주는지 몰랐습니다. 의심만하다가 이내 받아들이고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일로 인해 노동자들끼리 더 많은 대화와 믿음이 오갔습니다.”
세넷은 이 현상을 신뢰의 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타인을 믿을 수 있는가? 보답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가? 이 공장의 노동자들은 ‘예’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공동체’라는 전제를 두어서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보충설명을 듣고 나서 공장 또는 사회라는 전제를 두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단 하루였지만 호텔 알바를 하며 같은 알바생 두 명과 상사 욕을 하고, 서로의 잘못을 숨겨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내가 친화력이 진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강의를 듣고 보니 사회 현상이었다는 것을 알았네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타인을 믿을 수 있는가?” 저는 예라고 답하면서도 막상 그 직장의 분위기에 휩쓸려 갈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두번째는 이동은씨 였습니다.
이동은씨는 음식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이야기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녁을 스스로 챙겨먹던 동은씨는 요리를 자연스레 배웠습니다. 그것이 빛을 바란 건 대한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아침을 만들어 먹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점점 요리 실력은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자취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간단한 3분 음식에 손이 가더니 점점 쌈장밥 된장밥 등을 해먹었습니다.
요리를 할 줄 앎에도 요리의 과정보다는 배고픔 해결에 비중이 커졌고 그런 자신에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문탁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문탁에서는 자신이 요리 할 날을 정하여 공동밥상을 준비합니다.
이때 동은씨는 “자취요리와 문탁 요리의 차이점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존재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음식을 만드는 경험은 주변의 관계들을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혼자 살게 되었을 때 요리해주시던 분들이 생각나는 것 처럼요.
저도 최근 친구들과 함께 저녁으로 먹을 샌드위치를 만들면서 동은씨의 강의가 생각나고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5분 만에 뚝딱 샌드위치를 만들 텐데 친구들이랑 하니까 정성이 들어가는구나. 요리를 같이 하면 그 잠시일지라도 식구라는 관계로 들어서게 되는 것 같다고요.
세번째는 김고은씨 였습니다.
김고은씨는 붓다와 나우시카를 통해 헬조선에 대한 나의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헬조선 : 한국에서 근본적인 사회문제 때문에 살기 어렵고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해당 단어 표현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떠오르는 신조어이다. (나무위키)
헬조선에 있다면 쉽게 생각나는 것이 분노와 무기력입니다. 이를 붓다의 책에서는 악마 빠삐만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악마지 사실 나 자신이라고 봐야합니다. 그리고 붓다는 신이 아닌 지상에서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인간입니다.
빠삐만은 붓다의 제자에게 ‘너와 이 세계는 누가 만들었는가? 어디서 생겨났고 어디서 소멸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질문은 함정입니다. 이세상의 배후가 있다는 것은 세상에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배후가 있다면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이렇듯 고정 된 것 없이 뭐든 계속 변하고 사라졌다가 나타납니다. 감정 또한 같습니다. 어떤 일에 의해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붓다가 말하는 첫 화살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라지고 나타남을 인정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무기력해지면 붓다가 경고하는 두 번째 화살이 날아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헬조선에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고은씨도 분노와 무기력에 많이 휩쓸려 다녔지만 붓다를 공부하고 나우시카를 알게 되면서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절대 한국이 지옥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상황파악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분노라는 감정에 녹아들면 정말 상황 판단력이 느려집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것도 정말 역량인 것 같아요.
마지막은 김지원씨 였습니다.
김지원씨는 결과와 과정을 목공과 연결해서 얘기 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중요할까 좋은 과정이 중요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시작합니다.
디자인에는 motive 그리고 what 마지막으로 how를 따집니다. 물론 3가지를 다 따질 수 없기에 하나에 비중을 크게 둡니다.
지원씨는 최근 두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두 군데에서 how를 놓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예쁜 쓰레기를 만들었다’며 웃지만 사실 쓰레기를 처분하기란 아주 어려운 문제여서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해요.
디자인과정에서 무엇에 비중을 두냐에 각 장단점이 있지만, 특히나 how의 영향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100년전 까지는 what과 how가 분리 될 수 없었습니다. 어느 하나 구조를 생각하지 않는 작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how는 가격이 결정합니다. 그러다보니 안전하기보다는 간단함을 따지게 되었습니다. how를 고민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how는 예쁨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지원씨는 무언가 만드는 과정이 우리 삶과 닮았다고 합니다. 제작의 과정에서 how의 비중이 작아지는 만큼 삶에서도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중이 작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에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침대가 라돈덩어리인 줄도 모르고 몇 년을 썼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원씨가 저에게 과정과 결과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고민 없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취욕이 없어서 그런지 결과에 큰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원씨는 아직 고민 중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번 강의를 듣고 더욱 과정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how? 어떻게? 다만 문제는 경제적인 면에서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두명씩 질문시간도 있었는데, 유튜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현장에서만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에요.
다음은 11월 18일에 !마지막! 강의가 열립니다.
'지난 세미나, 행사 > 유투브 미니 강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후기] 11월 마지막 강의 (0) | 2019.01.02 |
|---|---|
| 9월 콜라보 강의가 업로드 됐습니다. (0) | 2018.11.30 |
| 초대합니다) 두 번째 유투브 콜라보 강의에 초대합니다. (0) | 2018.10.14 |
| [후기] 9월 첫 유투브 강의가 열렸습니다. (0) | 2018.09.28 |
| 초대합니다) 4인4색-유투브-콜라보-연속-강의 (0) | 2018.09.05 |